more
율곡 이이(李珥, 1536~1584년)
임진나루 화석정(花石亭)에서
 |
|
유불도 3교에 해박하였던 율곡은 화담 서경덕, 토정 이지함 등으로 이어오는 상수학(象數學)의 풀이로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나라에 큰 전란(戰亂)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였다. 1583년(선조 16년) 율곡은 자신이 죽기 1년 전 선조에게 ‘10만 양병설(養兵說)’을 건의하였지만, 오히려 그 자신이 삼사(三司)의 탄핵을 받고 병조판서에서 해임되었다. 하지만 망해가는 나라를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었던 그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비유적으로 또는 은유적인 방법으로 훗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책을 치밀하게 준비시켰다.
그는 먼저 도승지 유성룡(柳成龍)에게 막 출사한 이순신(李舜臣)이 앞으로 나라를 구할 큰 인물이 될 터이니 나라에 전란이 일어나면 그를 중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문중의 종친이기도 했던 이순신을 별도로 불러 주역에 근거한 ‘달은 어두운데 기러기가 높이 난다(月黑雁飛高), 독한 용(龍)이 잠긴 곳의 물은 편벽되이 푸르다(毒龍潛處水偏靑)’라는 두보의 시 구절을 암송해 둘 것을 권하였다. 또한 자신의 수제자인 백사 이항복(李恒福)에게는 ‘슬프지 않은 울음에는 고춧가루를 싼 주머니가 좋다’는 말로 전란의 대비책을 일러주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유성룡은 이순신을 무려 5단계의 계급을 올려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에 임명함으로써 옥포, 당포 등 초반의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후 이순신은 율곡이 생전에 일러준 ‘두보의 시’에 영감을 받아 ‘쌍학익진법(雙鶴翼陣法)’을 펼침으로써 한산도대첩과 명량해전을 대승하면서 임진왜란의 기선을 잡았다. 한편 명나라의 4만 지원병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평양성에 도착하였던 이여송(李如松)이 왜군과 싸울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이항복이 고춧가루 주머니를 차고 눈시울을 붉히자 이여송이 마지못한 듯 전쟁에 응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율곡의 선견지명이 가장 돋보인 것은, 그 옛날 야은(野隱) 길재(吉再, 1353~1419) 선생이 세우고, 율곡의 5대조가 중수한 임진강 변의 화석정(花石亭)이다. 율곡은 평소 하인들에게 정자의 기둥과 석가래 등에 평소 기름칠을 많이 해 두도록 주문하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의 어가(御街) 행렬이 급히 한양을 빠져나와 임진나루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음력 3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믐밤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도무지 뱃길을 잡을 수가 없었다. 이때 율곡이 위급할 때 읽어보라며 이항복에게 써 주었던 봉서를 열어보자, ‘정자에 불을 붙이라’라고 쓰여 있었다. 율곡은 선조 일행이 이 길로 행차할 것임을 이미 8년 전에 내다본 것이다.
선조는 율곡의 ‘10만 양병설’을 믿지 않았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회한의 눈물을 뿌리며 의주로 파천하였다. 이후 1년간의 몽진(蒙塵)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나루터 강변에 제물을 차려 놓고 파천 당시 어둠 속에서 뱃길을 열기 위해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은 병사들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지냈다. 이때 선조가 천우신조로 돌아오게 된 것에 감격하여, 그간에 신지강(神智江)으로 불리던 강 이름을 임진강(臨津江)으로 부르도록 하였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임진왜란 직전과 같은 국내외적 혼란에 휩싸여 있는 것은 아닌지. 임진강이 휘돌아 흐르는 화석정 난간에 서서 율곡의 선견지명을 회억(回憶)해 본다.
최재호 칼럼니스트·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저작권자 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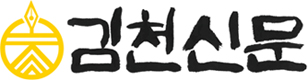



 홈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