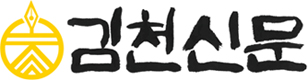more
 홈
교육·문화·음악
종합
홈
교육·문화·음악
종합
새로나온 책 - 바람에의 빙의와 그 여타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5.02.20 16:53
수정 2025.02.20 16:53
노중석 시조집 『백비白碑 앞에서』
바람에의 빙의와 그 여타
『백비白碑 앞에서』는 노중석 시조시인의 『비사벌 시초』(1993), 『꿈틀거리는 적막』(2011)에 이은 세 번째 창작 시조집이다. 그 사이에 시조선집 『하늘다람쥐』(2006)를 내기도 했다. 시조시인으로, 과학교사로, 서예가로 세 트랙의 행로를 걸어온 노중석 시조시인이 십 년 넘어 오랫만에 낸 개인 시조집이다.
노중석은 다변인인이 아니며 과작寡作으로 정평 나 있는 시조시인다. 그의 시조 또한 핵심이 행간에 숨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위의 시조집들을 일람해 볼 때 근래에 올수록 장시조화 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단시조를 주로 써오는데, 이번 시조집에는 2수 이상으로 구성된 연시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총 58편의 시조가 5부로 묶여있다.
내용상 노중석의 시조는 전통적 서정, 자아 성찰, 우주 질서, 사물 관조, 사향思鄕, 메시지 전달 등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번 시조집 제5부에는 그동안 모아온 벼루에 대한 인연과 애정, 미의식을 읊은 시조들이 한 데에 묶여있다. ‘벼루1’에서 ‘벼루13’까지 부제를 붙인 시조들에서 고른 시조와 옛 벼루에 대한 시조가 별도로 묶여있다. 알다시피 그는 서예로 독보적 성취를 이뤄오면서 문방사우의 하나인 벼루를 골라 수집하고 있는 명품 벼루 수집가이다. 수많은 벼루들과 인연을 맺어 심미적 정취와 고아한 아치를 나누며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
바람의 종류도 다양하다. 찬바람(「범종 소리」), 칼바람(「묵죽도」), 바람결(「저녁놀」, 「제주 한란」), 솔바람(「직지천의 봄」, 「허공2」, 「금강산 소경」), 훈풍(「파적」), 모래바람(「선인장」), 골바람(「갓바위」), 눈바람(「하늘길」) 등등. 노중석이 가장 선호하는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 솔바람이다. 그 솔바람은 속세에 있지 않고 직지사 암자들이 둥지를 튼 황악산이나 금강산, 허공 그리고 전설 속의 신선과 함께 있다.
그럼 노중석의 시조에서 ‘바람’이란 시어가 지니는 시그니피에는 무엇일까. 대부분이 시적 자아가 관조하는 자연 또는 객관적 상관물, 어떤 매개체로 쓰이고 있는데 좀 더 고차원적인 쓰임은 없는가. 있다. 시련 또는 고난의 본체(「모래바람」, 「누구를 위하여」, 「바보새」)인가 하면, 자아를 채근하는 주체(「별과 나무」), 희원의 대상(「별」, 「별빛으로 오시는 그대」), 설법 또는 진리(「금강산 소견」), 유랑의식(「하늘은」)이기도 하며 시적 자아에게 각성을 주는 객체(「동구밖 느티나무」)이기도 하다. 그는 벼루 속에서도 바람이란 자연(「옛 벼루를 어루만지며」)을 발견해 낸다. ‘바람’이란 시어가 두 번 이상 활용된 작품도 몇 편이 있다. 노중석 시인은 가히 바람에 빙의하여 독자에게 그 해석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노중석은 창녕에서 태어나 김천이 좋아 김천에 정착해 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 시조시인이다. 시력 50년을 넘기는 노중석이 김천의 여타 시조시인과 더불어 민동선-배병창·정완영-장정문의 맥을 이으며 지역 시조문단에서 돋보이는 업적을 쌓아 가리라 기대된다. 노 시인의 시조집 『백비白碑 앞에서』(동학사, 2024) 이후가 더 기다려지는 까닭이다.
민빛솔(경북대평생교육원·시인)
저작권자 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